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의 차기 선장을 뽑는 공모전이 지난 16일 막을 내렸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김영섭 현 대표가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약 20~30명에 달하는 전·현직 임원과 외부 전문가, 관료 출신들이 '독이 든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누가 후보인지보다 과연 이번 선임 절차가 '주인 없는 회사'의 고질병인 정치적 외풍과 왜곡된 지배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에 쏠려있다.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사회가 주도하는 이번 레이스는 시작부터 짙은 안갯속이다.

차기 CEO가 마주할 KT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는 단순한 보안 실패를 넘어 조직의 지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황태선 정보보안 상무는 해킹 관련 서버 폐기와 외부업체의 의심 정황 보고에 대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는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외부에서 대거 충원된 임원들과 기존 구성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여기에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전략적 판단 착오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2조4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 독립을 강조하는 '소버린 AI'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떨어진 움직임"이라며 "KT가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지금 KT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외부 혁신가'라기보다 조직의 비공식적·내부적 메커니즘까지 이해하는 '내부 조정자'에 가깝다"는 모 언론 보도에 나온 김준익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진단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밖에서 영입된 '해결사'가 아니라 무너진 조직 문화를 재건하고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 "왜곡된 지배구조"…정당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회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리더를 선출해야 할 이사회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KT 사외이사 8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통신·AI 분야 전문성보다는 정권과의 연결고리가 더 뚜렷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의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당시 구현모 전 대표는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 등 외부의 반대로 좌초됐고 이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며 약 5개월간의 극심한 경영 공백 사태를 겪었다.

이번 공모에 불참하며 쓴소리를 쏟아낸 구현모 전 대표의 일침은 그래서 더욱 뼈아프다. 그는 "KT의 역사, 문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모르는 분들은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직격하며 "KT의 지배구조가 왜곡된 결과로 탄생한 이사회로부터 다시 심사받는 것이 온당한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임 절차 자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이번 공모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안갯속 경쟁…'올드보이' 귀환이냐, '외부 전문가' 등판이냐
![(왼쪽부터)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홍원표 전 SK쉴더스 사장.[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220941133953.jpg)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은 화려하다. 내부에서는 유일한 현직자인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이 조직 내 지지를 기반으로 도전장을 냈고 과거 CEO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윤영 전 사장, 남규택 전 부사장 등 '올드보이'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섰다. 외부에서는 홍원표 전 삼성SDS·SK쉴더스 대표,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통신·IT·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누가 되든 그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내부 출신이 선임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조직 쇄신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할 것이고 외부 인사가 오면 또다시 '낙하산' 논란과 함께 내부 구성원과의 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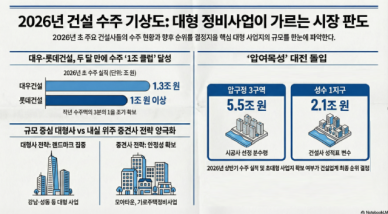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