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 공장은 보통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생산 규모에 따라 수익성이 극명하게 갈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한 산업이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공장 증설비는 물론 전기, 토지 등 여러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막대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LCD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냈고 한때 ‘프리미엄’으로 여겨졌던 OLED까지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 작은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 패널업체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전년 동기 28.4%에서 30.6%로 올라섰다. OLED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61.0%에서 65.5%로 4.5%포인트 확대되며 ‘기술 주도권’을 다시금 입증했다.
품목별로는 OLED 스마트폰 패널이 전년 대비 35.9% 증가한 6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용 OLED는 무려 57.6% 늘어난 1억8600만 달러에 달했다. 태블릿용 OLED도 16.8% 성장하며 신수요 창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만의 시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 없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739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OLED는 5.2% 늘어 323억 달러가 예상되지만 LCD는 1.0% 성장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에 대해 제재 예비 판결을 내리며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당장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진 못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반사이익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과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해 입지를 다져야 한다.
정부 역할도 뒷받침돼야 한다. 전폭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수출 규제 완화 등 전략적 지원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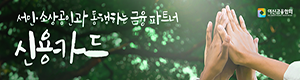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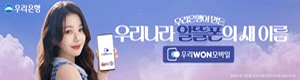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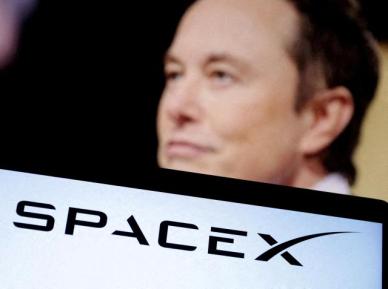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