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모리 반도체 한 축인 D램 평균 가격이 하락세를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황이 '업턴(상승 전환)'을 곧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 신호로 보합세를 기록한 D램 가격과 국내 반도체 생산지수 상승, 삼성전자의 감산 강화 등이 거론됐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가 집계한 현재 주류 D램 제품인 DDR4 8기가비트(Gb) 9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30달러로 전월(8월)과 같았다. 또 다른 축인 낸드플래시는 가격 지표 하락세가 이보다 좀 더 일찍 멈췄다고 파악됐다.
여기에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반도체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3.4% 늘었다고 나타나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생산량을 줄였는데 각종 수치에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 통계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메모리 가격과 정부 통계만으로 국내 반도체 '투 톱(2 top)'이 상승 기류에 올라탔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 DS부문과 SK하이닉스의 3분기(7~9월) 합산 영업적자를 4조~6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4분기 흑자 전환 성공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지만 실패 쪽이 우세하다.
메모리 제품은 공급자 수가 한정적이어서 기업이 협상과 감산(재고 조정)을 통해 시장 가격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매출액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90% 넘게 차지하고 낸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더해 미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가 80% 이상을 장악한 과점 시장이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은 반도체 감산 기조를 강화 또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D램 30%, 낸드는 40% 줄이기로 했다. 재고를 더 빠르게 털어내고 고객사와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D램·낸드 가격을 각각 10%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반도체 업황이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무엇보다 제품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이른바 전방 수요는 개인 컴퓨터(PC)와 모바일 제품, 기업과 데이터센터 서버 등이 책임진다. 업계에서는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본다.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제 상황이다. 미국은 고물가·고금리에, 중국은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에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통화 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확산하려는 중국 간 엇박자에 유럽과 아시아 경제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이상 조짐을 보인다면 메모리 전방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 메모리 업황은 2~3년간 상승·호황과 1~2년간 하강·불황을 반복해 왔다.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이어가며 메모리 사이클(순환)이 그간 관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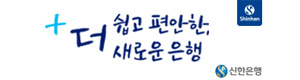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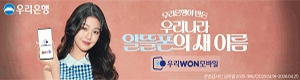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