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미래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 개편 및 시너지 확보, 그룹 전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룹 핵심 기반 사업을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 7대 핵심 사업 기반으로 설정해 기존 철강 중심 회사 이미지를 벗겠다는 것이다.
일단 물적 분할 후 신설되는 철강 사업 회사는 ‘포스코(POSCO)’라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으로, 철강 생산 및 판매 관련 일체의 사업을 담당한다.
이차전지소재 사업은 양·음극재 생산 능력을 현재 약 11만 5000톤에서 2030년 68만 톤까지 확대하고, 선도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먼저 양극재는 국내와 중국에서 배터리사를 공략한 생산기지 집적화를 추진하고, 미국에서는 GM과의 합작을 통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 능력을 2030년 42만 톤까지 확장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음극재는 흑연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실리콘계 사업에 진출해 2030년 26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흑연의 경우 천연흑연 공급처를 탄자니아, 호주 등 중국 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인조 흑연도 이번 달 1단계 준공을 마친 국내 공장을 기반으로 자체 수급 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소 사업은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 2조 3000억 원, 생산 50만 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년간 사업을 고도화하여 2050년까지 연간 700만 톤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포부다. 안정적인 내부 수요를 기반으로 적극적 외부 판매까지 연계하는 수소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지주사 소재지 논란의 여진이 남아 있어서다. 당초 포스코 그룹은 지주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수도권에 지주사를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년 이상 포스코 소재지였던 포항과 시의회 등 지역사회는 포스코 지주회사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홀딩스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시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수도권에 두기로 한 건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투표로 결정된 사안이어서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결정 번복을 두고 지주사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던 주주들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포스코 최대주주와 2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9.75%)과 씨티은행(7.3%)이다. 나머지 80%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 개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정되는 만큼 기관을 제외한 기타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예상했던 지주사 소속 직원들을 얼마나 분산 배치할지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이미지 확대

[사진=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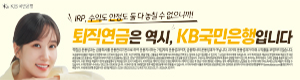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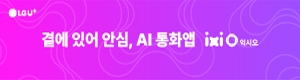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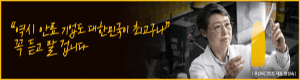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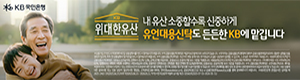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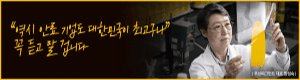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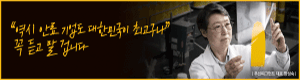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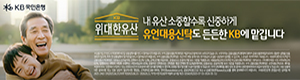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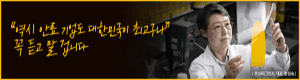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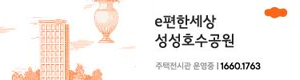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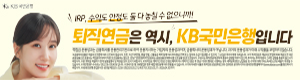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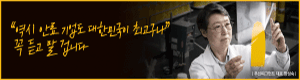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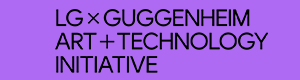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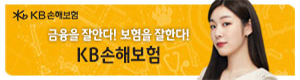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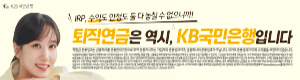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