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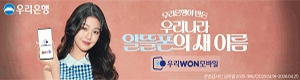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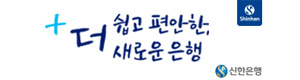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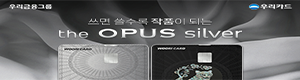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