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율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PM) 법 제정 등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픽사베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30/20230630155407660193.jpg)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기존 교통수단보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대체 수단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유 플랫폼과 함께 등장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예다.
전동킥보드는 첫 출시 당시 혁신이라며 환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최근 불편한 존재로 전락했다.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 의도치 않게 위협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인도에서 타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미착용 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승차 정원 초과 금지, 주행 속도 25km 제한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규제에 전념을 다 하고 있지만 노력이 무색하게도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 1735건으로 매년 약 2배씩 늘었다.
프랑스 파리는 계속되는 사고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기로 했다. 파리시는 20개 구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운영 여부를 물었다. 이에 총 10만3084명이 주민 투표에 참여했고 89%가 전동킥보드 철수를 찬성했다. 이에 따라 파리시에서는 국내에서도 실시했던 '라임'을 비롯해 도트, 티어 등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의 1만5000여대의 기기를 회수하기로 했다. 파리시는 올해 9월1일까지 전동킥보드 철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파리시와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언급된 법적 규제에도 사고는 늘어가고 특히 무면허 운전은 '유명무실' 규정에 불과하다. 길에서 대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도 면허 인증 체계를 갖추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을 땐 출퇴근 시간에는 즉시 견인되며 그 외 시간에는 업체가 기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1시간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PM 법 제정 등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관련 법이 없어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역시 한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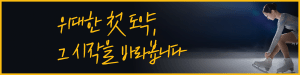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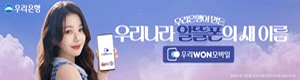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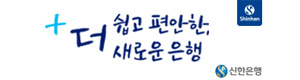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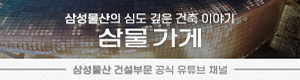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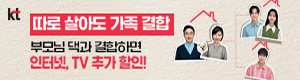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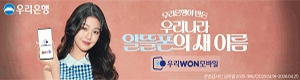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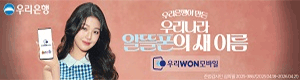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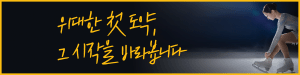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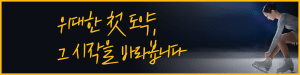








![[현장] 美 시장 진출에 컬리N마트까지…컬리, 샛별배송 성과 IPO로 이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24925375728_388_136.jpg)



![[UDC 2025] 에릭 트럼프 디지털 자산은 혁명, 지금이 뛰어들 최적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12810264864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