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신화통신) 영국 자선단체 데트 저스티스(Debt Justice)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저소득 국가의 외채 상환액 가운데 39%는 중국 외 상업 대출기관, 34%는 국제 다자기구로 향한 반면, 중국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채 위기를 다룬 여러 보도에서 중국이 흔히 '최대 채권자'로 묘사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일부 채권자가 채무 추심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업체 글렌코어(Glencore)는 차드에 대한 채무 감면을 거부했고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채권자는 잠비아와의 협상에서 채무 감면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해밀턴리저브은행은 스리랑카 채무 조정안을 거부하며 뉴욕 지방법원에 스리랑카 정부를 고소했다.

이같은 상업 대출 기관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서구권 기관이다. 데트 저스티스 관계자는 "서방이 아프리카 부채 위기를 중국 탓으로 하는 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서방 은행과 자산운용사, 석유 거래상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통계는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부채 규모가 아니라 대출의 성격과 조건에 있음을 말해준다. 장기적 발전에 중점을 둔 인내 자본과 달리, 서구권 위주의 상업 채권자와 다자 금융기관은 단기에 높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혹한 상환·추심 조항 내지 정치적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금리의 강경한 근시안적 대출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발전권을 약탈해 가는 진짜 '함정'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헤라르도 토레스 온두라스 외교차관은 라틴아메리카 발전을 가로막은 진짜 악몽은 서구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1989년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규제 완화, 국유기업 민영화, 무역 및 금융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며 이를 대출 조건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다수 국가에서 경제 주권이 약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

장기간 누적된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개도국의 경제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중국은 협력을 통해 상대국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장기 투자로 발전 병목 현상 극복을 돕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이 약 10만㎞의 도로, 1만㎞가 넘는 철도, 100개에 육박하는 항만을 건설해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과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을 키웠다.
궁극적으로 이번 '부채 함정' 논란은 글로벌 발전권과 발언권을 둘러싼 경쟁의 일환이다. 아울러 서방이 주도하는 부채 체계는 개도국의 경제 자주권에 족쇄를 채우고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중국식 협력 모델은 이러한 속박을 타파하고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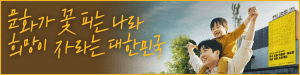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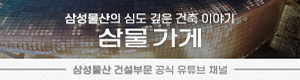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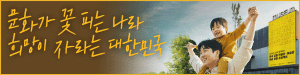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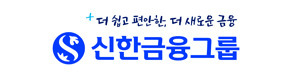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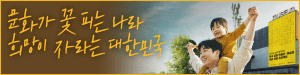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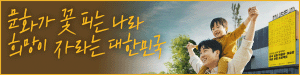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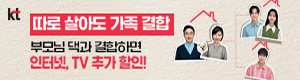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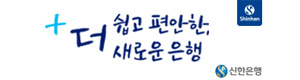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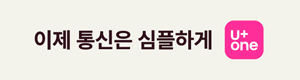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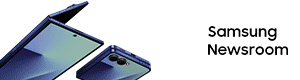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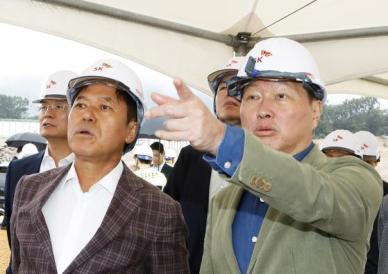








![[현장] AX 시대 출발선에 섰다…2026 정보통신·방송 R&D 설명회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52745494349_388_136.jpg)
댓글 더보기